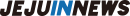4.3! 그 歷史의 소용돌이 속에서

채병덕총참모장은 서둘러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최창식 공병감에게 한강다리를 폭파하라고 명령했다. 한강 인도교가 거대한 굉음을 울리며 무너진 것은 6월28일 새벽 2시30분쯤이었다. 이때 인도교 위를 걷고 있던 민간인과 군인, 차량들도 교각과 함께 한강으로 떨어졌다.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한강다리 폭파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미아리고개에 포진해 있던 국군병사와 서울시민들을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다.
인민군 주력부대가 서울시내에 진입한 것은 6월28일 오후 3시쯤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강 다리 폭파는 6∼8시간 정도 연기했어야 했다. 그 6시간 동안 아군 3개 사단이 장비와 함께 더 도강할 수가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병력이다.
한강다리 폭파는 다른 국군부대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 춘천사수를 외치던 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이 소식을 듣고 이날저녁 6시쯤 춘천시민에게는 “피난하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춘천의 소양교를 폭파하고 원주로 후퇴했다. 봉일천 일대에서 인민군 6사단과 1사단을 악착같이 막아내던 백선엽 대령의 1사단도 사수를 포기하고 한강을 건넜다.
한편 동해안에 포진한 이성가(李成佳·당시 28세)대령의 국군8사단은 전창덕(全昌德)소장이 이끄는 인민군 5사단으로부터 수륙양쪽에서 공격받았다. 즉 인민군 5사단은 2개 연대를 정면으로 침투시켜 국군8사단을 압박하고 동시에 1개 연대를 태백산맥 쪽으로 우회 침투시켰다. 또 게릴라부대인 766부대와 549부대를 함정에 태워 동해안 곳곳에 상륙시켜 동해안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한다.
한강다리를 너무 이르게 파괴한데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50년 9월15일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한다. 최대령은 21일 처형됐다. 채병덕 참모총장은 물론이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동의 없이 한강교를 폭파할 수는 없었으리라는 상식에 비추어보면 이 재판은 속죄양 만들기였다고 들었다.
우리는 서울 중앙청주변 어느 여관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었다. 오늘이 1950년 6월 30일이고 낮에는 계속 비행기가 폭격을 하여 서울시내 곳곳이 불타고 있었고 연기가 자욱하였다. 식사 중에도 폭탄이 떨어지니 숨기를 반복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하고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었다. 인민군대장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들어라. 지금 국방부동무들이 서울시민들을 폭격하여 죽이고 있으니 동무들이 복구 작업을 하러 가야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솔하여 가는데 도착하여 보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포탄에 맞아죽은 사람, 파편이 박혀 신음하는 사람,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 울부짖는 사람, 피를 흘리며 절규하는 소리는 아비규환 그 자체이자 지옥이 따로 없는것 같았다. 차 밑에 시체가 깔려있고 나뭇가지에도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여기저기 빨래처럼 걸려있었다.

더군다나 집 주변과 시내는 수도관이 터져 물바다를 이루어 그 참혹함이 더해져 말로 형언 할수 없을 만큼 참혹하였다.
우리들은 시체를 한곳에 모아놓는 일을 하였다.
저녁때는 전기선이 끊어져 암흑세계로 변하였으며, 인민군장교의 말은 한국군이 폭격을 하는 것은 무기와 탄약저장고에 폭격을 하는 것인데 용산에 있는 무기 탄약고를 폭파하려다가 오폭이 되어 주변민가에 폭탄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고 건물이 불타고 차량이 부서졌다고 했다.
다음날 1950년 7월 1일 아침새벽 4시, 우리들을 기상시키고 전원 밖으로 집합하라고 하여 인민군장교가 하는 말이 “동무들은 들으시오. 지금부터 행군을 할 것이다”라고 하여 나와 고행문형은 행군대열에서 걷기 시작하였다. 낮에는 폭격을 피하여 들과 나무 밑에서 쉬고 밤에는 행군을 하여 삼사일 동안을 걸어 도착한 곳이 개성에 있는 인민군훈련학교였는데 아침새벽이었다. 아침식사를 하고 부대편성을 하니 정식적으로 인민군대 훈련병이 된 것이다.
1950년 7월 5일, 우리는 어떻게 이 훈련을 받을 것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였다. 그 날은 내무반을 배치 받고 청소도하고 정리정돈을 하면서 하루를 쉬고 취침을 하였다. 언제면 전쟁이 끝나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날 것인가를 우리 둘은 계속 속삭이며 이런저런 생각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밝을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새우잠에 빠져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