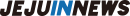시/김세진, 시평/현달환

자동차 안에서 세상 밖을 바라보고 있다
금방이라도 폭풍이 밀려올 듯
흔들거리는 나무들 그리고 진회색 하늘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일그러진 모습
정신없이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발걸음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은
바깥에서 바라보는 안쪽은
5미리 정도 되는 유리창의 경계를 두고
완전한 흑과 백의 풍경이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만큼
거친 음악 소리에 잠을 청한다
들숨 날숨 내는 소리마저 귓가에 들릴 만큼
오싹한 공포가 밀려올 듯
혼자라는 현실에 나를 가둔다
유리,
유리창 하나로 안과 밖의 세상은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지우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다
자동차 밖에서 세상 안을 바라보고 있다
-김세진의 '차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
세상이 온통 추위로 깔려있다. 여기저기서 콜록거리는 기침소리에 추위는 더욱더 매섭게 다가온다. 그런 와중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자동차는 어쩌면 최고의 언덕일 수 있다.
가끔 자동차안에서 그런 공상과 상상을 해본다. 평생을 자동차 안에서 생활하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자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가끔 나는 자동차가 인간에게 주는 즐거움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알았다.
바람을 피하려 들어온 자동차는 추위를 이겨내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느껴 자동차는 또 하나의 집이면서 방이고 나만의 의자, 공간이라 느껴본다.
유리창이 크게 있어 더욱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지라 세상에 대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자동차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은/ 바깥에서 바라보는 안쪽은/ 5미리 정도 되는 유리창의 경계를 두고 / 완전한 흑과 백의 풍경이다.
그렇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지않는 사람을 목격하고 자동차를 타지않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목격한다. 무심코 혹은 우연히.
완전한 흑백이 있는 사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닐 수 있다.
우리는 유리벽이란 큰 벽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에 어쩌면 슬픈 자동차를 타면서 다니고 있지 않는지 가끔 슬픈 현실을 느끼곤 한다. [현달환 시인]
관련기사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24)갑질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23)네 꿈을 펼쳐라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22)골무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21)가을비 오는 날에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20)그래도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19)편지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18)가을강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17)길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16)신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15)그리움의 편지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14)감나무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13)별리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12)상강 무렵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11)장마, 세이지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32)어느 날의 꿈
- 詩원한 제주인의 아침(33)제주 섬 들불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