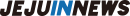시/이무자, 시평/현달환

계단 틈새 가녀리게 피어나는 노란 민들레
오르내리는 발길에 밝히고 밟혀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꽃잎
손님의 갑질에 따귀를 맞는 백화점 직원
빨갛게 달아오른 뺨
아프다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갑’이 올리고 내리는 발길에
밟히고 밟혀도 일어나 웃어야 하는 ‘을’
그곳에도 노란 민들레꽃이 피어난다
그늘진 얼굴로 피어나는 하얀 미소
“고객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무자의 ‘갑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조어를 먹고 살고 있다. 그러한 줄 알면서도 그러한 신조어를 탄생시킨다는 것은 사회현상에서 일어나는 파생어라 할 수 있겠다. 스마트폰이란 기계로 인해 우리는 몰라도 되는 기능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그런 공중에 줄타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도 그것은 좋다. 그래도 그것은 참을 만하다. 갑이니 을이니 병이니 하는 말은 과거 번호 숫자 대용으로 쓰던 것이 이젠 힘의 논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갑이란 말만 들어도 우리는 강자임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접미사 '질'이란 글자를 첨가시키면 그야말로 참을수 없는 서러움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도 갑질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갑’이 올리고 내리는 발길에 / 밟히고 밟혀도 일어나 웃어야 하는 ‘을’이 아닌 그 '을'과 '갑'이 서로 공생하고 처지를 돌보는 그런 관계를 보고 싶다. 그것이 사람인(人)의 탄생의 의미가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 '갑'이나 '을'이나 모두.[현달환 시인]
관련기사
현달환 기자
jejuin@jeju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