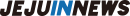4.3! 그 歷史의 소용돌이 속에서

1949년 4월에 백암사골 반선 마을에서 김지회, 홍순석이 사살되었고 2,298명이 토벌군에 투항하고 사살자는 392명이라 하였다.
지리산의 높은 산악지대로 도피해 들어간 반란군이 토벌대에 의해 거의 소탕되자, 남조선 노동당에서는 산속에 남아있는 반란군과 이들을 돕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민간인들을 규합하여 활동한 단체가 지리산 유격대라 하였다.
조직책임자는 남조선노동당 연락책임자인 이현상이다. 이는 자진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지휘격려하면서 군경과 싸워야 한다며 앞장섰다고 한다.
이 사람은 일제 강점기시대에 일본경찰이 요사찰 대상 인물로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지역민들이 말을 하였다.
지리산 유격대 공식명칭은 1949년 7월부터는 제2병단 유격대’라 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병단 밑에는 제5연대, 제6연대, 제7연대, 제8연대, 제9연대의 5개연대가 있었는데, 총인원은 500여 명이고 연대장에는 이형희, 이현상, 박종하, 장금모, 맹 모 등인데, 이 연대들이 배치한 구역은 동부 지리산, 광양 백운산, 조계산, 덕유산을 근거지로 하여 군경에 대항하여 유격전을 벌였다고 한다.
이때 지리산 문화공작대 사건이 있었는데, 문화부장에 김태준이, 시 부에는 유진오가 그리고 음악부에는 유호진, 영화부에는 홍순학 등이 파견하여 유격대 문화 활동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후에 토벌 군인에 붙잡혀 서울로 가서 총살형을 받았다고 하였다.
당시의 국군 호남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은 송호성 준장이고, 제2여단장에는 원용덕 대령 제5여단장에는 김백일 중령 등이 공비 소탕작전에 임하였고 경찰기동대도 끊임없는 공격을 가하면서 지리산 제2병단유격대는 거의 괴멸상태에 이르렀고, 이때 북한의 강동학원 유격대를 양성하여 6백여 명이 오대산지구로 들어와서 유격활동을 하였지만 군경에게 잡히거나 일부는 북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제주도 남제주근 출신 대정중학교 교사였던 김달삼(본명 : 이승진)은 북한으로 넘어가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는데, 50년 3월 북한군소장으로 진급하여 제7군단을 이끌고 동해안 주문진항으로 상륙하여 남한에서 게릴라전을 폈는데, 대원은 전부 강동 학원출신 300명과 부사령관은 남도부, 나 훈, 성동구였다. 일명 이 부대를 ‘동해여단’이라고 하였다. 1병단 잔존병력 100여명 중 국군 제6연대 탈주병 80여명과 야산 부대에서 일부 흡수한 사람을 합해 6백여 명이 넘었으나 국군 제3사단과 경찰기동대와 교전에서 거의 괴멸되어 김달삼과 남도부 그리고 몇 명의 생존자는 월북했다는 말도 하는데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지금의 나는 피난길의 인민군도 아니고 일반주민도 아닌 복장만 인민군복만 입었을 뿐 소속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된 셈이다. 강을 건너면서도 총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물속으로 몸을 숨겼다 일어서기를 수없이 여러번 되풀이하며 겨우 강가에 닿아보니 신발도 벗겨져 없었고 옷은 다 물에 젖어있었다. 이때가 1950년 10월 중순경이라 추워서 몸이 떨렸다. 하지만 이 사지(死地)를 벗어나야 한다는 긴장감으로 계속 걷기 시작했다.

사람은 생사의 기로에서는 체면이나 염치같은 것은 없고 오로지 본능만이 작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강물을 헤엄쳐 건너는중 신발이 벗겨져 맨발로 걷다보니 한국 군인이 죽어 있었는데 마침 그의 신발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그 군인 시체에서 신발을 벗겨 신었으니 그나마 다행으로 걸을 수가 있었다.
일행은 벌써 앞에 멀리 걸어가 있었고 큰소리로 부를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지 망설여진다. 담배냄새를 따라 한참을 걷다보니 일행 중 일부를 만났는데 앉아서 인원점검을 하고보니 20명밖에 없었다. 또 몇십 명이 죽거나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다보니 아침이 밝아와 마을이 보였다. 우선 배가고파서 걸을 수 가 없었다. 우리는 누구의 지시도 없이 마을로 가서 여러 집을 살펴보았으나 사람들은 모두 피난가고 아무도 없었다. 마당 앞을 보니 땅을 팠던 흔적이 보여 그 곳을 파보니 제법 식량이 묻혀 있었다. 그것을 꺼내어 생쌀을 한주먹 먹고 밥을 지어 먹기도 하였는데, 우리 제주도 4.3사건 때의 실정하고 똑 같았다.
그런데 마을한쪽에서는 우리 일행이 아닌 인민군전투부대가 먼저 도착하여 소와 돼지를 잡아먹고 있었다. 먼저 삶은 고기를 먹고 있어서 우리도 얻어먹었다. 이 마을에서 밥과 고기를 실컷 먹고 남은 양식과 고기는 보따리에 싸서 20명이 함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처음길이라 어딘지 모르지만 잊혀지지 않는 1950년 10월 20일이었다. 내무서(지서)에서 피난길을 떠난지 20여 일 동안 들녘에서 지내면서 새우잠도 자고 또 밤에 걷고 하다 보니 몸은 야위었고 기력은 떨어져 말이 아니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일행을 따라 기약 없이 걸어야만 했다.
우리일행은 경상북도 상주군 어느 산기슭 8부 능선에서 일렬횡대로 앉아서 잡담도 하고 고향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담배도피우고 잠시 쉬고 있었다. 마침 가을비도 부슬부슬 오고 추운 날이었다.
이 때였다. 갑자기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공격 앞으로!”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각자 산 밑으로 데굴데굴 굴러 떨어지거나 어떤 사람은 숲 속으로 도망가기도 하였는데, 나는 마침 돌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를 은폐, 엄폐삼아 납작 엎드렸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총에 맞은 모양이었다. “아이고”하며 단발마 비명소리를 내더니 다음에는 아무 소리가 없었다. 즉사한 모양이다. 나는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다. 총소리는 내 쪽으로 점점 계속 가까워지면서 주변을 수색하는 것 같았다.
엎드려서 옆의 산 쪽을 바라보니 나무사이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 사람을 향해 계속 총을 난사하는 것이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